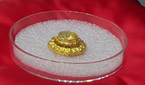조향래 객원논설위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엔 이슬 맺힌 백일홍/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던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찬비만 내린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울어본다고 다시 오랴 사나이의 첫순정/ 그대와 둘이서 희망에 울던 항구를/ 웃으며 돌아가련다 물새야 울어라' 고운봉이 부른 '선창'은 비 내리는 쓸쓸한 부두를 배경으로 이별의 아픔을 담은 노래이다.
노랫말 속의 '비릿내 나는 부둣가'는 국권을 강탈당한 조국의 강산을, '이슬 맺힌 백일홍'은 내 나라에 살면서도 남의 나라 신민이 되어버린 조선인을 상징한다. 비 내리는 선창가에서 떠나간 연인을 생각하는 것은 잃어버린 나라를 그리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선창'은 일제강점기 지식인과 학생층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고, 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여전히 삶이 고단했던 서민 대중의 애창곡이었다.
고운봉의 가수로서의 자질을 한눈에 알아본 것은 태평레코드 문예부장 박영호였다.그때부터 '고운봉'이라는 예명을 얻고 전속 가수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인기 가수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오케레코드 이철 사장의 스카우트로 소속사를 옮긴 고운봉은 이듬해인 1941년 여름에 발표한 '선창'이 공전의 히트를 하며 인기 가수로 부상했다. 조명암이 작사하고 김해송이 작곡한 노래였다.
일제의 야만적 수탈이 막장으로 치닫던 시절, 조선인들의 삶은 궁핍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 피폐한 터널 속에서 겪어야 했던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선창'이란 노래로 승화된 것이다. 항구를 떠나 머나먼 타관땅을 정처없이 떠돌다가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 다시 돌아온 쓸쓸한 선창가에 내리는 찬비. 그것은 망국민과 실향민의 눈물이었다. 깊은 좌절과 가이없는 허무의식의 표상이었다.
데뷔곡이자 최고의 히트곡인 '선창'으로 스타의 반열에 오른 고운봉은 '홍등야곡' '백마야 가자' 등을 연속 히트하며 김정구 남인수와 함께 광복 전후 가요계를 풍미했다. '선창'은 부두에서의 이별과 슬픔을 고운봉의 카랑카랑하면서도 우수 어린 목소리에 담아 오늘날까지 그 독특한 정취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작사자와 작곡가가 월북하는 바람에 이름을 바꿔서 금지곡을 피해가는 곡절도 겪었다.
선창(船艙) 즉 부두에서의 사랑은 다소 부박(浮薄)하다. 부평초 같은 사람들의 뜨내기 사랑이 많다. 여름날 폭풍우처럼 왔다가 봄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곳이 선창이다. 항구는 운명적으로 이별이 예고되어 있는 공간인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떠나는 쪽은 남자이고 남아서 그리워하는 쪽은 여자인 경우가 많다. 가수 심수봉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부른 이유를 알만하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고 한 말 또한 의미심장하다. 남자란 자고로 또 다른 항해에 나서고 또 다른 항구를 지향하는 속성을 지녔던가.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항구의 선창이나 포구의 부두는 그래서 만남의 장소이기보다는 이별의 장소로 많이 기능한다. 항구를 분기점으로 삼아 사랑하고 이별하는 노래가 많은 까닭이다.
항구에서 이별과 마주한 여인의 아픔과 그리움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서정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징병 그리고 정신대로 끌려간 이별의 공간도 결국은 항구였다. 항구의 이별은 그래서 역사적 정서의 울림으로 나타나고 민족의 정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하 대중가요에 '선창'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대중의 처량한 신세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노랫말 속의 '비릿내 나는 부둣가'는 국권을 강탈당한 조국의 강산을, '이슬 맺힌 백일홍'은 내 나라에 살면서도 남의 나라 신민이 되어버린 조선인을 상징한다. 비 내리는 선창가에서 떠나간 연인을 생각하는 것은 잃어버린 나라를 그리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선창'은 일제강점기 지식인과 학생층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고, 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여전히 삶이 고단했던 서민 대중의 애창곡이었다.
고운봉의 가수로서의 자질을 한눈에 알아본 것은 태평레코드 문예부장 박영호였다.그때부터 '고운봉'이라는 예명을 얻고 전속 가수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인기 가수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오케레코드 이철 사장의 스카우트로 소속사를 옮긴 고운봉은 이듬해인 1941년 여름에 발표한 '선창'이 공전의 히트를 하며 인기 가수로 부상했다. 조명암이 작사하고 김해송이 작곡한 노래였다.
일제의 야만적 수탈이 막장으로 치닫던 시절, 조선인들의 삶은 궁핍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 피폐한 터널 속에서 겪어야 했던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선창'이란 노래로 승화된 것이다. 항구를 떠나 머나먼 타관땅을 정처없이 떠돌다가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 다시 돌아온 쓸쓸한 선창가에 내리는 찬비. 그것은 망국민과 실향민의 눈물이었다. 깊은 좌절과 가이없는 허무의식의 표상이었다.
데뷔곡이자 최고의 히트곡인 '선창'으로 스타의 반열에 오른 고운봉은 '홍등야곡' '백마야 가자' 등을 연속 히트하며 김정구 남인수와 함께 광복 전후 가요계를 풍미했다. '선창'은 부두에서의 이별과 슬픔을 고운봉의 카랑카랑하면서도 우수 어린 목소리에 담아 오늘날까지 그 독특한 정취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작사자와 작곡가가 월북하는 바람에 이름을 바꿔서 금지곡을 피해가는 곡절도 겪었다.
선창(船艙) 즉 부두에서의 사랑은 다소 부박(浮薄)하다. 부평초 같은 사람들의 뜨내기 사랑이 많다. 여름날 폭풍우처럼 왔다가 봄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곳이 선창이다. 항구는 운명적으로 이별이 예고되어 있는 공간인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떠나는 쪽은 남자이고 남아서 그리워하는 쪽은 여자인 경우가 많다. 가수 심수봉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부른 이유를 알만하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고 한 말 또한 의미심장하다. 남자란 자고로 또 다른 항해에 나서고 또 다른 항구를 지향하는 속성을 지녔던가.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항구의 선창이나 포구의 부두는 그래서 만남의 장소이기보다는 이별의 장소로 많이 기능한다. 항구를 분기점으로 삼아 사랑하고 이별하는 노래가 많은 까닭이다.
항구에서 이별과 마주한 여인의 아픔과 그리움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서정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징병 그리고 정신대로 끌려간 이별의 공간도 결국은 항구였다. 항구의 이별은 그래서 역사적 정서의 울림으로 나타나고 민족의 정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하 대중가요에 '선창'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대중의 처량한 신세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尹, 내주 용산서 이재명과 첫 회담…협치 물꼬 트나
- 정부 “내년 의대증원 인원 50~100% 내 자율모집 허용”
- 이스라엘, 6일만에 보복 공격…이란 “드론 3대 격추”
- 한전, 한전 KDN 매각 보류…‘헐값 매각’ 논란에 제동
- 중동發 불안에 금융위 긴급회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
- 與 낙선 후보들, 당선인들 태도 지적 “희희낙락 참담해”
-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 이화영 ‘검찰 술파티’ 했다는 날…檢 일지엔 ‘구치소 복귀’
- SK하이닉스, TSMC와 손잡고 HBM4 개발…2026년 양산
-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들 주거지 압수수색











![[종합]이스라엘,이란 공습…6일만에 재보복](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9d/20240419010010920_77_50.jpg?c=202404191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