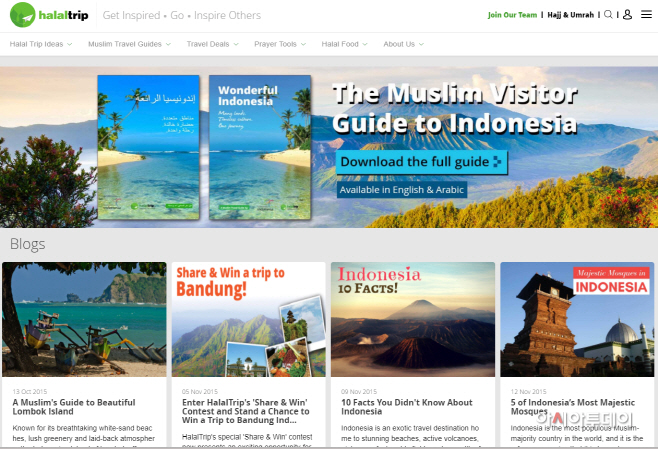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관광객 오마르 씨(52)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동쪽에 위치한 롬복섬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고 미 공영방송인 엔피알(NPR)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관광객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슬람교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를 잇는 ‘귀한 손님’으로 주목받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NPR에 따르면 전세계 최대 이슬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할랄’ 관광 사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고객을 잡아 관광 수익을 130억달러(약 14조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뜻하는 용어로, ‘할랄투어’는 무슬림 맞춤 관광을 뜻한다. 무슬림들은 할랄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려기 위해 모든 것이 제공되는 장소로 여행을 떠나길 원한다.
아리프 야하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은 이달 2일 관광부에서 주최한 관광 포럼인 사라세한 행사에서 지난해 총 관광객 수 1200만 명 중 270만 명이 이슬람교 대상 지역인 할랄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객 가운데 30만 명이 롬복섬에 방문했다. 이 섬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음식을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으로 바꾸는 등 무슬림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롬복섬에서는 무슬림이 기도를 드리는 사원(모스크)이 어디에서든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많큼 많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중동 지역 관광객을 약 20만 명밖에 유치하지 못했다. 이웃 국가인 태국은 같은 기간 60만 명의 중동 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슬림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에미레이트·카타르·에티하드항공 등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직행 운항편을 늘렸다. 또한 주요 관광지인 발리 외의 다른 지방으로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무슬림 여행객은 중국 관광객을 뒤잇는 큰손 손님으로 관광 사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할랄 관광 사 크리센트레이팅의 설립자인 파잘 바하루딘은 인터뷰에서 “세계에는 16억 명의 무슬림이 있다. 이는 16억 명의 잠재적 할랄 여행객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며 할랄 관광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무슬림 여행 컨설턴트사인 크리센트레이팅과 미국 카드브랜드인 마스터카드가 함께 조사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외를 방문한 무슬림이 수가 121만여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관광경제의 1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무슬림 관광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무비자 방문을 허가했다. 또한 나리타 국제공항에 할랄 식당과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기도 했다.
음식은 무슬림들이 비이슬람 국가를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15만 명 이상의 팔로우를 거느린 할랄관련 여행 정보 페이스북 페이지 ‘할랄을 가지면, 여행할 것이다(Have Halal, Will Travel)’의 관리자 싱가포르인 미카일 고는 한국·일본·싱가포르에 위치한 할랄 허가 음식점 정보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다. 아시아 지역에 할랄 문화가 급속도로 들어서자 그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특히나 무슬림 문화에 친화적인 편인것에 비해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