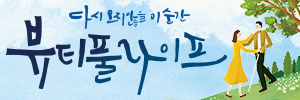|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이 40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안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에서 안전기준을 강화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일로 여긴다. 누군가가 이에 반대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하는 대중들이 원자력발전소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는 아닐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경험칙이 축적되지 않는 부문에서의 감각적 판단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일상에서의 안전과 달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는 목표가 있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정성적 안전 목표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대중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위험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수준을 법령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 안전도 대중과 환경에 대한 안전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의 시설 안전을 구분한다. 전자는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규제 대상이고 후자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규제기관의 책임 영역은 대중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준까지 규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규제는 대중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넘어서면 과규제가 된다. 과규제는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이고 사업자의 채산성은 악화할 것이다. 더 문제는 한 부문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면 사업자가 자원을 덜 중요한 영역에 쓰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한쪽 부분은 더 안전해질지 몰라도 다른 부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과규제를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사업자가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규제자와 사업자의 균형이 형성되고 최적의 안전성과 경제성 있는 전기가 나오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절대선'이 아니다. 미국 NRC의 경우에는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규제자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대중과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과규제는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